 친일ㆍ숭미에 살어리랏다
친일ㆍ숭미에 살어리랏다

- 저자 :정운현
- 출판사 :책보세
- 출판년 :2012-08-07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9-15)
- 대출 0/3 예약 0 누적대출 5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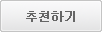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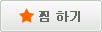
멀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오르는 길고 질긴 사대事大의 연원은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 수구기득세력에 잇대어 있다. 그래도 신라의 대당관계는 실리를 계산한 명민함이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면으로 맞장(대당전쟁)을 뜨는 기개라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주자학의 극성과 더불어 전염되고 임란 이후 더욱 공고해진 존화주의尊華主義는 참으로 목불인견이었다. 그 이후 사대의 대상이 일본(친일)과 미국(숭미)으로 바뀌는 사이 수구기득세력은 나라와 백성을 침략자들로부터 한 번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나라와 백성을 볼모로 내주고 자신들은 그 침략자들에게 빌붙어 대대로 영달을 누려왔다. 그런데 명색이 ‘자주독립국가’가 된 지 6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신판 사대주의자’들의 행태가 ‘구판 사대주의자’들을 찜쪄먹고도 남을 판이다. 이 책은 “뼛속까지” 친일이고 숭미인 '검은머리 외국인'들에 관한 치열한 기록이다.
숭미와 친일로 점철된 ‘이승만과 박정희 우상’이 지배해온, 그리하여 급기야 “뼛속까지 친일·친미” 정권이 들어서 독판을 치게 된 한국현대사의 비극을 읽는다.
지은이 정운현은 몇 안 되는 친일(파)문제 연구가이다. 그 연구로 보낸 세월이 20여 년이니 징그러운 집념이다. 그는 지난해 《친일파는 살아있다》를 탈고한 뒤 “친일문제의 개관은 마무리했다”고 여겨 당분간은 친일문제를 손에서 놓고자 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파동이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몰래 체결’ 미수 사건을 비롯한 친일 망동들이 잇달으면서 “덮었던 책을 다시 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지은이는 “생각 끝에 2011년 5월부터 오마이뉴스에 ‘정운현의 역사 에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친일문제 연재를 시작하여
2012년 7월 현재 40회에 이르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하지 싶다. 이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발생한 사안을 지난 역사에 비춰보는 방식으로 쓴 글이다.” 이 책은 그 가운데 주로 ‘신사대주의’에 관한 글들을 추려 엮은 것이다. “대개는 ‘친일’과 관련된 것들이고, 더러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이면사를 다루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이 역시 ‘친일’과 무관치 않았으며, 오히려 친일의 현재사적인 문제를 현실감 있게 다루는 주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요즘에서 친일문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신판 친일파’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극우단체인 ‘새역모’와 맥을 같이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 같은 것이 그런 예라고 하겠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수구세력의 변함없는 면면한 본질을 밝히고 있다. ‘사대事大’로 영화를 누려온 ‘검은머리 외국인’들이고 “뼛속까지 사무친” 충성심으로 영혼마저 바쳐온 민족반역자들이자 역사의 배반자들이다.
이종석(전 통일부장관)이 <에필로그>에서 신랄하게 적시한 “수구의 본질과 친일의 악취”는 참담하고도 서글프다. ― “그들은 스스로를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것은 위장에 불과하다. 반칙과 특권이 몸에 밴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수구일 뿐이다. 그들의 뿌리는 친일이다. 속성은 반주권적 기회주의이며 생존방식은 배타적 독식이다. 해방 후 친일파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아래서 청산은커녕 오히려 집권세력으로 소생하였다. 그리고 장면, 박정희 시대를 넘나들며 기득권 세력으로 뿌리를 내렸다. 반민족 행위의 전력 때문에 그들에게 국가주권이나 민족이라는 말은 ‘경기’가 날 만큼 부담스러운 용어였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대신 붙잡은 것이 반공의 끈이었으며 미국 숭배주의였다. 그들의 반공은 맹목적 반공주의로 흘러 오늘의 색깔론으로 이어졌으며 숭미는 우리 사회에 과도한 대미의존심리 구조를 고착시켰다. 수구세력이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은 분단체제이며 남북대결구조였다. 그들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빨갱이’로 몰기를 서슴지 않으며 여러 세력 간의 공존을 거부하고 부와 권력의 독식을 추구해왔다.”
숭미와 친일로 점철된 ‘이승만과 박정희 우상’이 지배해온, 그리하여 급기야 “뼛속까지 친일·친미” 정권이 들어서 독판을 치게 된 한국현대사의 비극을 읽는다.
지은이 정운현은 몇 안 되는 친일(파)문제 연구가이다. 그 연구로 보낸 세월이 20여 년이니 징그러운 집념이다. 그는 지난해 《친일파는 살아있다》를 탈고한 뒤 “친일문제의 개관은 마무리했다”고 여겨 당분간은 친일문제를 손에서 놓고자 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파동이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몰래 체결’ 미수 사건을 비롯한 친일 망동들이 잇달으면서 “덮었던 책을 다시 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지은이는 “생각 끝에 2011년 5월부터 오마이뉴스에 ‘정운현의 역사 에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친일문제 연재를 시작하여
2012년 7월 현재 40회에 이르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하지 싶다. 이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발생한 사안을 지난 역사에 비춰보는 방식으로 쓴 글이다.” 이 책은 그 가운데 주로 ‘신사대주의’에 관한 글들을 추려 엮은 것이다. “대개는 ‘친일’과 관련된 것들이고, 더러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이면사를 다루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이 역시 ‘친일’과 무관치 않았으며, 오히려 친일의 현재사적인 문제를 현실감 있게 다루는 주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요즘에서 친일문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신판 친일파’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극우단체인 ‘새역모’와 맥을 같이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 같은 것이 그런 예라고 하겠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수구세력의 변함없는 면면한 본질을 밝히고 있다. ‘사대事大’로 영화를 누려온 ‘검은머리 외국인’들이고 “뼛속까지 사무친” 충성심으로 영혼마저 바쳐온 민족반역자들이자 역사의 배반자들이다.
이종석(전 통일부장관)이 <에필로그>에서 신랄하게 적시한 “수구의 본질과 친일의 악취”는 참담하고도 서글프다. ― “그들은 스스로를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것은 위장에 불과하다. 반칙과 특권이 몸에 밴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하는 수구일 뿐이다. 그들의 뿌리는 친일이다. 속성은 반주권적 기회주의이며 생존방식은 배타적 독식이다. 해방 후 친일파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아래서 청산은커녕 오히려 집권세력으로 소생하였다. 그리고 장면, 박정희 시대를 넘나들며 기득권 세력으로 뿌리를 내렸다. 반민족 행위의 전력 때문에 그들에게 국가주권이나 민족이라는 말은 ‘경기’가 날 만큼 부담스러운 용어였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대신 붙잡은 것이 반공의 끈이었으며 미국 숭배주의였다. 그들의 반공은 맹목적 반공주의로 흘러 오늘의 색깔론으로 이어졌으며 숭미는 우리 사회에 과도한 대미의존심리 구조를 고착시켰다. 수구세력이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은 분단체제이며 남북대결구조였다. 그들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빨갱이’로 몰기를 서슴지 않으며 여러 세력 간의 공존을 거부하고 부와 권력의 독식을 추구해왔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




